– 호주 조나이 유기양돈농장
글·사진 원승현


호주 멜버른의 북서쪽 외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데일스포드Daylesford. 이 작은 마을 근처를 지나 잠시 가다 보면 ‘windows 배경화면인가?’ 싶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들이 펼쳐진다.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조나이 유기양돈농장Jonai Farms Meatsmiths이 있다.
윤리적인 맛을 추구하는 조나이 농장
멜버른 도심에 살던 농장주인 태미Tammi Jonas와 스튜어트Stuart Jonas 부부는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2011년 데일스포드 지역에 약 9만 평 규모의 유기양돈농장을 설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양돈 사육환경이 농업환경 중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돈을 선택했다고 한다. 아직도 휴식기엔 세계 곳곳의 돼지농장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지속한다는 이들의 열정에 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조나이 농장은 2013년 호주 최초로 농장 안에 유기 가공장을 설치했고 2014년에는 육류 숙성 시설과 가공장을 확충했다. 스튜어트가 직접 육가공을 하기에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또한 소비자 반응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판매와 생산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농장을 넓히기보단 작은 규모를 유지하며 좋은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구조, 소비자와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여신 돼지들의 행복한 신전
조나이 농장 규모는 9만 평. 총 100여 마리의 돼지와 20여 마리의 소를 키운다. 어마어마한 면적에서 키우는 동물의 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적다. 구역별로 어미돼지 한 마리와 새끼돼지들만을 놓아 키우는데 조성한 초지를 주로 먹이고 부족하면 맥주를 발효하고 남은 찌꺼기나 날달걀로 보충해 준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제외하곤 거의 1년 내내 초지를 뛰어다니며 자란 돼지가 75kg 정도 되었을 때 도축하고 고기는 약 45kg을 얻는다. 일반적인 돼지들은 5개월도 안 되어 도축되지만 조나이 농장에선 8개월 정도 키워 도축한다. 한국과는 품종이 달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연과 함께 느리게 키우고 있다.

시장가격이 아닌 생산비용이 가격의 근거
조나이 농장에서는 80가구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지원농업) 회원을 유지하며 40가구씩 한 달에 두 번, 2주에 걸쳐서 소 2마리와 돼지 12마리를 회원들에게 배송한다. CSA 도입 초반에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회원을 늘렸는데 현재는 가입 대기 회원 대비 이탈 회원이 적어 우스갯소리로 20년을 기다려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입하지 못한 회원들은 대부분 조나이 농장같이 유기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연결시켜준다고 한다.

호주에 가기 전 나는 CSA의 개념을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농장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정도로 생각했다. CSA 소비자를 일종의 구매 서포터로 보고 농장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로만 바라본 것이다. 농산물은 구매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서비스의 의미로 접근했다. ‘신뢰할 수 있는 농장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해보고 농장과 소통하자’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이것은 소비자가 농장을 직접 보고 골라 보라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CSA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농장을 돕는다는 개념은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예상치 못한 공급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 농민은 소비자와 위험을 분담하고 소비자는 농장과 더 밀접한 관계 맺음을 통해 식량 생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소비자들은 농장이 지속되지 못했을 때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나이 농장에서 특히 놀랐던 것은 1년에 한 번 정규 미팅을 통해 시장가격이 아닌 농장 생산비와 경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생산물의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직접 농장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왕이 아닌, 함께 농장을 만들어가는 주인으로서 땅을 살리는 건강한 농업과 농업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호주에서 본 한국농업의 미래
사실 호주에 오기 전까지 막연하게 호주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땅이 넓은 농업 선진국이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이고 농사짓는 환경이 한국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민 평균 나이가 늘고 있고 농업을 하려는 젊은이가 없으며 외국의 자본 있는 대기업들이 농업시장을 잠식해 오는 등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태미와 스튜어트 같은 사람들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점에는 묘한 동질감까지 느껴졌다.
한국에도 윤리적으로 생산하는 많은 농부가 있고 이를 존중하는 수많은 소비자가 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아직 CSA 개념이 생산자를 돕는다고만 여기고 자신을 돕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상생할 수 있는 CSA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CSA 모범 사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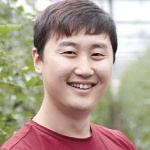 ※필자 원승현: 그래도팜 대표. 홍익대 프로덕트 디자인과를 졸업 후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35년 동안 유기농사를 이어온 부모님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유기농장 그래도팜을 운영한다. ‘밭에서 브랜드를 짓다’라는 개념으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농장 브랜드 관리를 하며 ‘브랜드 파머’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활동 중이다.
※필자 원승현: 그래도팜 대표. 홍익대 프로덕트 디자인과를 졸업 후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35년 동안 유기농사를 이어온 부모님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유기농장 그래도팜을 운영한다. ‘밭에서 브랜드를 짓다’라는 개념으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농장 브랜드 관리를 하며 ‘브랜드 파머’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