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철 KIST 책임연구원, 친환경에너지사업단장

35년간 ‘똥’ 밭에 구르다
어쩌다보니, 그의 이름을 들으면 ‘똥’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영문 이름의 이니셜도 ‘W.C. Park’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 똥 박사라는 별명도, 35년째 분뇨를 연구하고 있는 것도 숙명이 아니냐는말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박완철 박사(KIST 책임연구원, 제7회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 이야기다.
“제 한자 이름이 밝을 완晥, 물 맑을 철澈입니다. 물을 맑게 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제가 하는 일과 맞아 떨어집니다.”
농학박사인 그는 1981년 KIST에 입사해 정화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오수 정화조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고효율 축산폐수 정화조, 대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생활하수처리시스템 등 분뇨를 자원화하고 정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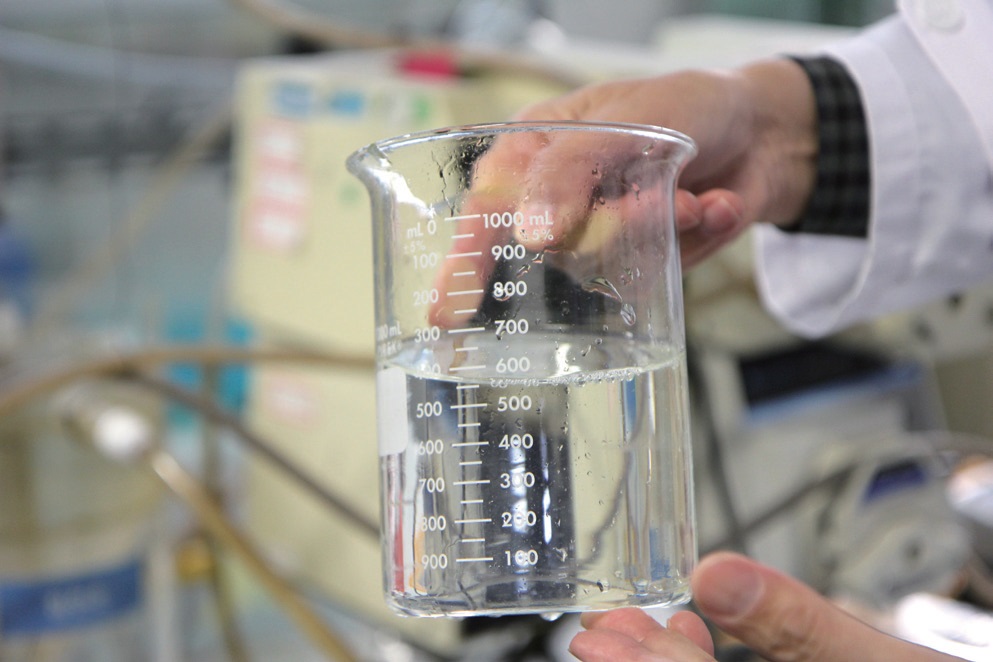
1998년 미생물을 이용한 고효율 축산정화조(KDST)를 개발, 보급한 공로로 제7회 대산농촌문화상을 받았다.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 그 후 2001년에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주는 ‘젊은 공학인상’을 받았고, ‘제1회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기술자상'(2002)과 ‘과학기술포장'(2008)을 차례로 받으면서 명실공히 ‘훌륭한 과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분뇨 연구 35년, 박완철 박사는 바이오 가스, 미생물, 오·폐수 정화 연구를 계속하면서, 친환경에너지사업단장과 환경 관련 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있다. 그리고 그가 애정을 갖고 꾸준히 해오는 일. 울산공단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규명하여 농민들에게 보상하는 일도 35년째다.
농학자의 도전, 과학자의 명예 농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완철 박사에게 농업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었다.
“농번기에는 가정학습 주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농사일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면 그때가 아니라도 학교에 가지 않고 농사일을 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었죠.”
장남이라 면서기를 하면서 농사짓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그는 상주 농잠학교에 진학했다. 농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합친 5년 과정 학교였다.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다고, 박완철 박사는 회상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해주었다. 그 뒤 그는 건국대 농대에 진학했고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농학자로서 유일하게 KIST연구원이 되었다.
“농업을 하지 않았다면, 어릴 때부터 똥 만지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정화조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축사에서 오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축산분뇨 정화조를 만들지못했겠죠.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애비 록펠러
1992년, 축산 정화조를 연구하고 있을였다. 미국록펠러Rockefeller 가에서 만든 환경관련기업 클리스브 사가 만든 분뇨처리 공정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애비 록펠러Abby Rockefeller 의 초청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보스톤 호텔에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흰 운동화를 신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자신이 애비라고 하더군요. 수행원도 없었어요. 그 길로 그녀의 지프차를 타고 보스턴, 웨스트버지니아, 피츠버그 현장을 다녔죠. ‘왜 분뇨를 오염물 취급해 버리느냐’며 대학 교수와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애비가 자신의 대저택으로 그를 초대해 가장 먼저 보여준 건, 화장실이었다.
“우리 집에는 변기가 없어요.” “여기에 지렁이도 살아요.” 하던 그녀는 급기야, “이건 냄새도 안 납니다.” 하면서 맨손으로 숙성된 똥을 조물조물거리며 코에 가져갔다. 당시 체이스맨하턴은행의 대주주이던 애비에게서, 미국의 재벌은 이런가?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박 박사는 회상했다. 그리고 ‘세상에 오염물은 없다’는 그녀의 외침 또한,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았다.
농촌마을엔 소규모 정화시설이 효과적, 우리나라엔 액비 사용이 제한적
지금은 대부분의 시설이 대규모화되는 추세지만, 박완철 박사는 농촌에는 소규모 정화시설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적합하다고 말한다.
“지금은 마을마다 하수도관을 통해 폐수를 보내면 대형처리장에서 한꺼번에 정화하는 시스템이라 관리는 편리하지만, 환경을 생각할 때 최선은 아닙니다. 소규모 정화시설을 마을마다 설치해서 마을에서 물이 정화되어 나오면, 맑은 물이 실개천을 따라 하천으로, 강으로 가게 됩니다. 실개천도, 강도 살게 되지요.”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일침을 가한다.
“초지가 대부분인 유럽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 시설은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아요.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들고 남은 액비는 초지에는 뿌릴 수 있지만, 우리는 식량작물을 키우는 논밭이 대부분이라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는 뿌리지 못합니다. 해양 투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퇴비화와 정화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박 박사는 효율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와 축분을 섞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정화와 퇴비화를 함께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미생물이 핵심이다
박완철 박사 연구의 핵심은 미생물. 오랜 시간, 수없는 시행착 오를 거쳐 그는 ‘바이오 클로드’라는 미생물 덩어리를 개발한다. 언뜻 보면 딱딱한 대리석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질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10여 종의 미생물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물에) 금방 풀어지면 안 되니까 농축한 거죠. 지금은 미생물들이 수면상태예요. 이것을 축분 처리장에 넣어두면 서서히 녹아서 그 안에서 활동해요. 이거 하나가 1㎏ 정도인데 5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죠. 100톤의 물을 5년 이상 정화할 수 있어요.”
이 미생물은 오염물을 정화하면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앞으로 미생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상에 버려질 것은 없다’는 철학과 ‘연구는 실용화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35년간 달려온박완철 박사. 그는 쉽게 버려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들로 세상을 살리는 ‘가치’를 찾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을 좀 더 온전하게 지키는 비법인 것이다.
글 신수경 /사진 김병훈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