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짓기’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의 필자가 집필한 에세이를 이어서 소개하는 코너로, 지난 호 강수희 씨에 이어 최성현 씨가 ‘농촌에 관한 단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관하여 적은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글·사진 최성현
![[크기변환]1](https://webzine.dsa.or.kr/wp-content/uploads/2022/09/크기변환1-1.jpg)
나는 하루 한 통씩 손글씨 엽서를 쓴다. 일요일에도 쓰고, 법정 공휴일에도 쓴다. 하루도 쉬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2022년 9월 12일로써 1447번째다.
낮에는 주로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해 지면 돌아와 책상에 앉아 쓴다. 나들이가 있는 날에는 지하철 안이나 여행지의 숙소에서 쓰기도 한다. 때로는 찻집에서 쓰고, 바다 곁에 앉아 쓸 때도 있다.
엽서는 작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글이 길어져서 엽서 한 장으로 모자랄 때는 다른 한 장을 이어붙여 쓰기도 한다. 엽서라지만 엽서만을 쓰는 것은 아니다. 진짜 엽서보다는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면지, 편지나 소포의 봉투, 달력, 포장지와 같은 엽서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살려서 쓴다. 가위로 엽서 크기로 잘라 쓴다. 특히 달력이 좋다. 달력 하나면,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여러 장의 엽서가 나온다.
하루는 신비하다. 크고 깊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조차 하루가 아니고는 자신을 드러낼 곳이 없다. 한 해 농사 또한 하루가 모여 이루어진다. 무슨 말로도 다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하루의 일을 나는 엽서에 옮겨적는다.
주로 산문 형태의 글을 쓰고 있지만, 시로 표현하는 게 좋은 글감이 올 때는 거기에 따른다. 산문시도 쓰고, 하이쿠1)도 애용한다. 서툴지만 그림을 그릴 때도 있다.
산이 보냈나
오늘은 우체통에
낙엽만 한 장
엽서 쓰기를 마치면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1년 과정의 자연농법 배움터인 지구학교 카페cafe.daum. net/earthschool와 밴드에 올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재 휴교 중이기는 하지만.

자연농법! 내 삶의 바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것을 나는 20대 후반이었던 1980년대 중반에 만났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길이 있다니! 가슴이 마구 뛰었다.
책을 통해서였다. 《짚 한 오라기의 혁명》이라는 책이었다. 자연농법 입문서로 널리 알려진 책이었는데, 강력했다. 그 책은 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사람 쪽에서 자연 쪽으로 건너왔다.
나만이 아니다. 자연농법은 전 세계의 여러 영혼을 흔들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첫째는 번역서다. 《짚 한 오라기의 혁명》은 내가 우리글로 옮긴 한국어판을 비롯하여 20개국이 넘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옮겨졌다. 다른 하나는 방문객이다. 그 책의 지은이이자 자연농법의 창시자인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원은 전 세계에서 온 이들로 늘 북적였다고 한다. 내가 갔던 1991년 5월에도 그랬다. 마치 성지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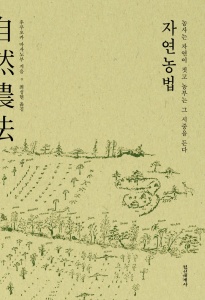
자연농법의 무엇에 나는 반한 것일까?
첫째는, 자연농법은 그 어떤 농법보다도 자연과 생명을 덜 해치기 때문이다. 자연농법은, 내가 아는 한, 가장 앞선 비폭력농법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자연농법에서는 땅을 갈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무경운을 제1 원칙으로 삼는데, 경운은 땅과 땅속 생물의 삶을 크게 파괴한다. 갈면 땅속 생물의 마을이 모두 망가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는다. 하지만 갈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지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다. 사람 대신 풀과 동물과 미생물이 갈기 때문이다. 어떻게 가나? 땅에는 풀이 난다. 작물도 있다. 작물과 풀은 뿌리와 줄기를 뻗으며 자라고 죽는데, 그것이 그대로 경운으로 이어진다. 동물과 미생물 또한 같다. 그들도 땅에서 마을을 이루고 산다. 길을 내고, 집을 짓는다.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닌다. 먹고 싼다.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다. 게다가 그들은 수가 무척 많다. 그러므로 그들이 있는 한 땅은 딱딱한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산과 같다. 갈지 않으면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갈면 또 갈아야 한다. 금방 다시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자연농법에서는 땅을 병약하게 만드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자연농법에서는 풀을 거름으로 삼기 때문이다. 풀이 나면 뽑지 않고 베어서 그 자리에 펴놓는다. 그러면 뿌리는 땅속의 거름이 되고, 잎과 줄기는 땅 위의 거름이 된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와 똥오줌도, 뜰에서 나는 풀과 나뭇가지도 하나 버리지 않고 논밭으로 낸다. 둑의 풀도 그렇다. 그러므로 자연농법의 논밭은 1년 내내 작물과 풀의 주검으로 덮여 있다. 벌거숭이 땅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바깥에서 들이지 않고도 안의 것을 알뜰하게 돌림으로써 논밭은 비옥해지고, 그 위에서 무비료(퇴비 포함)의 세계가 열린다.
자연농법의 논밭에는 다른 농법과 달리 풀이 있다. 자연농법에서는 풀을 뽑지 않고 베고, 베되 한꺼번에 베지 않고 한 줄씩 건너뛰어 베기 때문이다. 작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풀을 없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무제초의 길이, 달리 말해 풀과의 공생의 길이 무비료는 물론 무농약의 세계를 연다.

무농약이라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 땅을 갈지 않고, 화학비료는 물론 퇴비조차 쓰지 않고, 풀과 함께 가꾸기를 하면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달리 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풍요로워진 생태계의 종다양성이 병해충을 막아주는 것이다. 해충도 물론 있지만 익충도 있다. 천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농법에서는 농약이 필요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 자연농법에서는 벌레와 싸우지 않는다.
내가 자연농법을 좋아하는 두 번째 까닭은 농기계가 필요 없다는 거다. 톱낫, 괭이, 삽, 긴 자루 낫, 갈퀴, 도리깨, 키, 눈삽, 외발수레, 발탈곡기, 풍구와 같은 수동 농기구가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농기구 구입비가 거의 안 든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편 트랙터는 작은 것 하나에도 수천만 원이 든다. 그것으로 끝도 아니다. 비닐, 농약, 비료, 퇴비, 영양제, 퇴비 살포기, 농약 살포기, 이앙기, 파종기, 수확기 등 끝이 없다.
나는 지금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자연농법으로 자급 규모의 논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벼, 보리, 콩, 옥수수, 수수, 녹두,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들깨, 오이, 수박, 호박, 상추, 당근, 수세미……등을 자급하고 있다. 그리고 숲밭! 숲밭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있고, 그 아래는 먹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들나물과 산나물, 그리고 버섯이 있다. 우리 논밭은 언제나 조용하다. 공기도 늘 맑다. 강도 더럽히지 않는다. 아름답다. 사람들은 말한다.
“천국 같다!”
아니다. 그래도 숲 안에서 농사를 안 짓고 사는 개구리나 멧돼지나 하루살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연농법은 더 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일을 남은 생에 내가 해야 할 일로 알고 있다.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이 하루 한 통 손글씨 엽서 쓰기를 이어 하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죽는 날까지 계속하고 싶다. 왜 그런가? 그것이 내 꿈인 숲으로 더 들어가는 길을 찾고, 그것을 글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글로 쓰자면 필력이 필요하다. 1일 1엽서 쓰기는 그 기량을 쌓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한 통의 엽서를 쓸 것이다.
1) 5·7·5의 3구句 17자字로 된 일본 특유의 단시短詩.
 필자 최성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자연농법으로 자급 규모의 논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산에 산다》,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오래 봐야 보이는 것들》, 《좁쌀 한 알》과 같은 책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자연농법》, 《자연농 교실》, 《신비한 밭에 서서》와 같은 자연농 서적을 우리말로 옮겼다.
필자 최성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자연농법으로 자급 규모의 논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산에 산다》,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오래 봐야 보이는 것들》, 《좁쌀 한 알》과 같은 책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자연농법》, 《자연농 교실》, 《신비한 밭에 서서》와 같은 자연농 서적을 우리말로 옮겼다.






